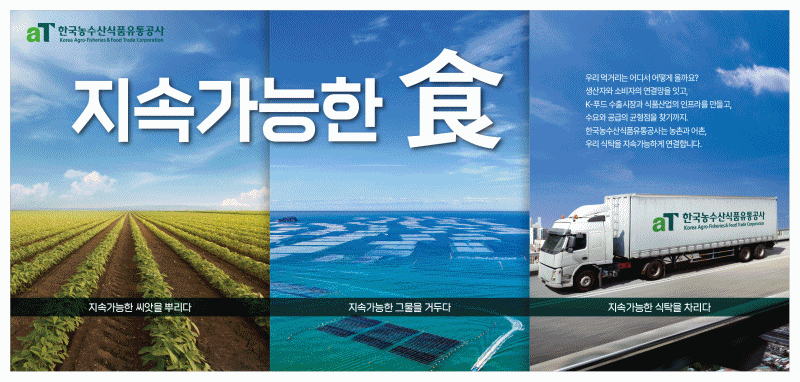농촌진흥청(청장 허태웅)은 최근 이상기상과 국지적 소나기 등 평년과는 다른 날씨로 벼 생육이 지연돼 장마철 큰 피해가 우려된다며, 병 발생 초기 방제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대부분 지역의 5월 중·하순 기온이 평년 대비 1~3도 낮은 저온현상이 나타나 일찍 모내기한 논의 벼 생육이 지연됨에 따라 본격적인 장마가 시작됐을 때 갑작스런 병 발생이 우려된다.
벼흰잎마름병은 주로 생육 중기인 7월 초·중순 처음 발생하며 장마와 태풍, 침수로 인해 확산된다. 잎이 말라 죽거나 하얗게 변해 광합성이 떨어져 쌀 품질이 나빠지고, 이른 시기에 감염되면 품종에 따라 줄기가 말라 죽는다. 발병 시기에 따라 생산량이 20% 이상 감소하기도 한다.
초기 병 증상은 바람이나 가뭄 피해, 키다리병 증상과 비슷하다. 이로 인해 방제시기를 놓치거나 다른 약제를 사용해 피해가 커질 수 있기 때문에 무엇보다 빠른 병 진단이 중요하다. 병이 의심되면 농촌진흥청 혹은 지역 농업기술센터 등에 문의해 피해를 예방한다.
특히 벼 잎 상처로 세균이 침입하므로, 태풍이나 침수 피해 직후에 적용 약제를 바로 뿌려야 한다. 기상조건에 따라 병의 최초 발생 시기가 매년 달라지므로, 병 발생을 확인한 후 주변 논을 살펴 병 확산을 예방한다.
* 벼흰잎마름병 최초발생 추이: (‘15)7월 초순→(‘16)7월 초순→(‘17)7월 중순→(‘18)7월 중순→(‘19)7월 중순→(‘20)7월 초순
벼 생육 후기에 잘 발생하는 세균벼알마름병, 벼잎집무늬마름병, 벼도열병의 예방과 방제도 중요하다.
세균벼알마름병에 감염되면, 낟알이 여물지 못해 이삭이 쭉정이가 되므로 생산량이 많이 줄어든다. 특히 이삭이 나오거나 꽃이 필 때 고온다습하면 병 발생과 피해가 증가한다. 이삭이 나오기 전후 옥솔린산이나 가스가마이신 계통 적용 약제를 뿌려 병 발생을 예방한다.
벼잎집무늬마름병은 벼가 무성해 군락 내부 온도와 습도가 높아지면 발생한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시기에 맞춰 발리다마이신에이, 헥사코나졸 계통 적용 약제를 뿌린다.
벼잎도열병에 감염되면 잎에 방추형 갈색 병징이 나타나기 시작해 병이 심해지면 포기 전체가 붉은빛을 띠며 생장이 억제된다. 잎도열병 병원균이 이삭을 감염시켜 이삭도열병을 발생시킨다고 알려져 있으므로 잎도열병 발생 초기에 병징이 나타나면 즉시 방제해 피해를 예방해야 한다.
특히 도열병은 낮은 온도의 다습한 환경에서 잘 발생하므로 장마가 늦어지는 올해에는 더욱 관심을 갖고 병 발생을 예찰한다. 병징을 확인한 즉시 카프로파미드, 트리사이클라졸 계통 등의 적용 약제를 뿌려 피해를 줄이도록 한다.
2019년 1월 1일부터 실시되고 있는 농약허용기준강화제도(PLS: Positive List System)로 국내에서 생산하는 모든 작물에는 등록된 약제만 사용할 수 있다. 병해충 약제 정보는 농촌진흥청 농약안전정보시스템에서 자세히 검색할 수 있다.
농촌진흥청 작물기초기반과 문중경 과장은 “올해 이상기상 환경에서도 벼농사에 피해가 없도록 병 발생을 미리 살펴 방제 정보를 적극 알리고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나하은 k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