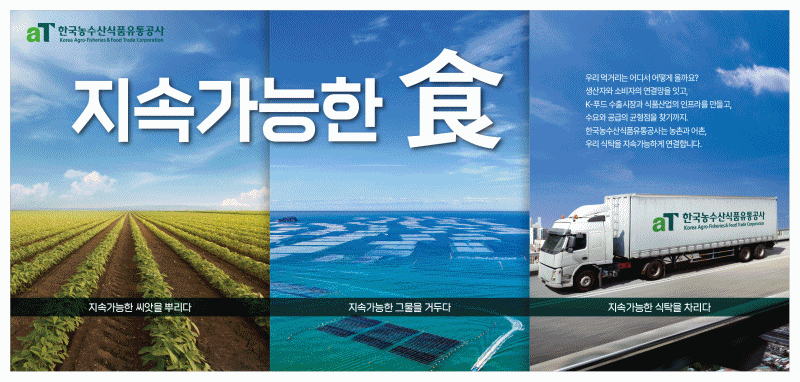농촌진흥청, 축사 화재예방 수칙 발표
2년간 축사 화재 건수 848건… 전기 시설 수시로 점검해야
농촌진흥청(청장 정황근)은 겨울철 화재로 인한 농가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축사시설 점검에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 2015년과 2016년 최근까지 전국에서 발생한 축사 화재는 848건으로 총 303억여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발생 건수는 소 축사(우사)가 349건(41.2%)로 가장 높았으며, 피해 규모는 돼지 축사(돈사)가 196억여 원(64.9%)으로 가장 많았다. 원인별로는 전기적 요인이 44.3%(376건)를 차지해, 전기시설 점검만으로도 화재를 상당 부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나타났다.
겨울철에는 가축의 보온을 위해 축사를 막아두는데 이는 축사 내부 습도 상승으로 전기누전의 위험성이 높이는 원인이 된다. 작은 실수로도 화재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축사내부에서 사용하는 전기시설이나 배선 설비는 반드시 정부인증을 받은 규격품을 사용하고 수시로 점검해야 한다.
보온등과 온풍기 등 전열 기구는 반드시 정해진 규격과 용량에 맞게 사용하고 문어발식 전기 배선은 절대 하지 않도록 한다. 전기기구는 반드시 접지공사를 실시해 누전에 대비하고 낡고 오래된 누전차단기와 배선 등은 전문 수리업체를 통해 수리, 교체해야 한다. 바닥이나 외부에 노출된 전선은 쥐 등에 의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배관 공사를 하는 것이 좋다.
또한, 비상상황에 대비해 초기에 화재를 진압할 수 있도록 적절한 소화 장비를 준비한다. 고압세척기나 소화 장비 등은 습기나 직사광선을 피해 잘 보이는 곳에 설치하고 반드시 사용방법을 숙지해야 한다.
한편, 겨울철 낮은 기온은 가축 및 축사 내․외부의 시설에 피해을 줄 수 있으므로 사전에 적절한 대비책을 마련해야 한다. 개방식 축사의 경우, 바람이 불어오는 방향에 차단벽을 설치해 가축들이 찬 공기에 직접적으로 노출되는 것을 막는다. 축사외부의 음수시설 등은 미리 단열 처리해 얼지 않도록 하며 가온급수기를 이용할 경우 전선의 연결 상태 등을 점검한다.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 축산환경과 이준엽 농업연구사는 “겨울철 축사의 화재발생은 농가에 막대한 피해를 가져오기 때문에 미리 점검하는 것만이 화재 예방의 지름길이다”라고 말했다. k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