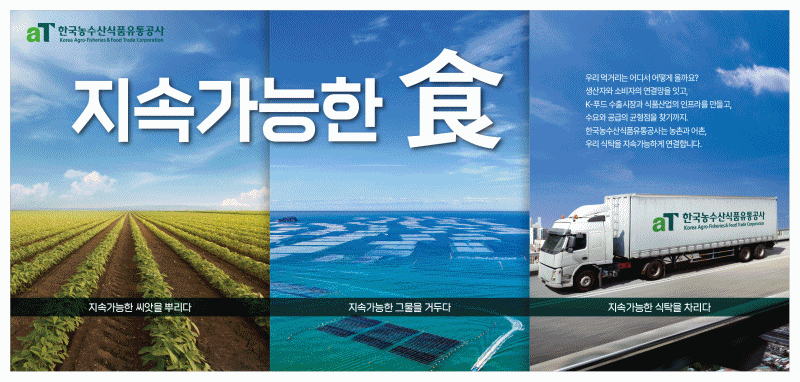둥글게 마는 디스플레이, 입는 전자소자 등 활용범위 무궁무진
산림과학원, 울산과기大 공동으로 꿈의 기술 첫발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윤영균)은 나무에서 추출한 셀룰로오스로 제조한 나노종이 분리막과 전극 이용해 종이처럼 휘어지는 배터리를 만드는 원천기술을 세계 최초로 확보했다고 밝혔다. 리튬이온전지와 이 전지에 포함되는 분리막의 세계시장 규모는 2013년 기준 각각 약 22조원과 2조원에 달한다.
시장규모는 2018년까지 160%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휘어지는 종이 배터리’는 최근 첨단 분야로 각광받고 있는 둥글게 말 수 있는 롤업(Roll-up) 디스플레이와 옷처럼 입을 수 있는 전자소자 등 다양한 디자인으로 활용 가능하기 때문에 세계적으로 주목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종이 배터리는 나무에서 추출한 나노종이 분리막으로 기존의 플라스틱 분리막을 대체하기 때문에 전극(+-) 간 계면이 매우 안정적이고 우수한 기계적 물성 확보가 가능하다.
특히 외부 압력에 의한 형태 변형에서도 전지 성능을 구현할 수 있어서 여러 전기화학 소자로 다양하게 활용될 수 있다. 반면 기존의 리튬이온전지는 음극과 양극에 들어가는 바인더(Binder, 접착제)가 전극의 전자전도도뿐만 아니라 에너지 밀도까지 감소시켜 물리적 유연성이 매우 부족하고 생산비용도 많이 드는 단점이 있었다. 종이 배터리는 국립산림과학원과 울산과학기술대학교의 공동 연구로 개발된 국내 순수 원천기술이다.
이번 연구는 나노 분야의 세계적 학술지인 ‘나노 레터스(Nano Letters)’ 인터넷 판에 9월16일 게재됐다. 이번 성과는 산림과학과 에너지공학이 협업(協業)으로 이룬 창조경제의 성공모델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한편, 산림과학원과 울산과기대는 세계 최초로 나노셀룰로오스로 만든 전극과 분리막을 일체화시킨 3차원 구조의 플렉시블 종이 배터리를 개발하고 상용화하는 공동 연구를 계속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하은 kenews.co.kr